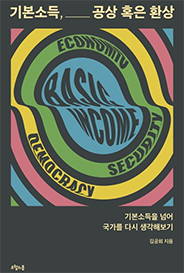이 주의 히든북 요약
1. 기본소득은 일찍이 토지 공개념으로부터 시작하였다.
2. 오늘날 기본소득의 재원은 플랫폼 기업에게 각출할 수 있다.
3. 공개념 형성을 위해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
#1 기본소득 논의의 보편성
시계를 조금 과거로 돌려본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0년,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유물로
알려졌던 기본소득을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고나와 눈길을 끌었다. 그런데 이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저자는 미국에서도 보수 경제학자로 유명한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12~2006)이 빈민수당으로 제안했던
음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가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이라고 소개하여 오늘날 기본소득 논의가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때마다 나오는 인기 메뉴임을 지적하고 있다(73~78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경제적 불평등으로 사회안정이 필요한 것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차이는 그 재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있을 뿐이다. 산업혁명 등 경제구조의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빈부격차는
더욱 커졌는데, 그 시기마다 기본소득 논의가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2 저자의 문제의식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논의는 보편적 분배냐 선별 분배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저자는 보수·진보를 가릴
것 없이 기본소득 성격의 정책으로 선전되고 있는 아동수당, 청년수당, 기초연금, 농민기본소득 등은 ‘보편적 급부’라는
형식만을 공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기본소득과 거의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돌발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기본소득 논의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7면).
저자는 기본소득 논의의 과거를 돌아보는 데 적잖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세 차례의 큰 파고가
있었다. 1차는 영국 산업혁명 이후 토머스 페인(Thomas Paine, 1737~1809)의 기본자산(21세에 달한 모든
시민에게 정액 15파운드를, 50세 이후 모든 시민에게 매년 10파운드의 연금을 죽을 때까지 지급), 토머스 스펜스
(Thomas Spence 1750~1814)의 기본소득(연령대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정기급여) 제안이 대표적이다(26~28면).
2차는 1873년 유럽의 대공황으로 20년간 지속된 대불황과 그에 따른 대규모 실업 사태 이후 20세기 초반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l, 1872~1970), 데니스 밀너(Dennis Milner, 1892~1956) 부부 등이
주장한 최소한의 소득보장, 국가상여금 제도 등 국가가 나서서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44~51면).
3차는 미국의 대공황 이후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기본’ 제안이 부활하게 된 것은 자본주의의 심화로
포스트-산업주의, 신자유주의, 진보주의 등의 여파로 본다(67~77면).
몇 차례의 산업혁명이 있었지만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경기후퇴와 경기불황은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는데, 저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된 기본소득 논의가 실패로 돌아간 것을 기본소득이 ‘기본’을 놓쳤기 때문으로 이해한다.
저자의 기본소득론의 핵심은 ‘(선별적) 징발’에 있다. 징발에 중점을 두지 않은 기본소득 논의는 허구라는
것이다. 이는 일부러 짐짓 꾸민 것일 수도 있고, 기본소득 논의의 역사를 모르고서일 수도 있다.
이점에서 저자는 전통적 기본소득 논의(토머스 페인과 토머스 스펜스)가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를 징발 대상으로
삼는 것에 주목한다. 모든 지대가 공동체에 의해 회수되어야 하는 것은 본래 땅은 모든 이들의 것이었기 때문인데,
따라서 회수된 지대가 공동체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하게 배분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기본소득은 결국
‘제 몫 돌려주기’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113~114면). 이렇게 보면 전통적인 기본소득론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를 주로 언급하는 반면, 오늘날의 기본소득론은 빅데이터나 플랫폼 등에서 나오는 수익, 또는
탄소세나 기타 환경세도 지대와 더불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꼽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114면).
저자의 보편적 징발의 대상에는 플랫폼도 들어 있다. 플랫폼이란 사실 멍석에 불과하고 그 가치는 거기 모인
사람들의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빅데이터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주인은 그 상호작용의 주체인 대중이라고
보는 것이다(114~115면). 만약 정부가 그런 수익을 징발해내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원래의 주인인 ‘우리 모두’에게
동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순리에 부합한다(115면).
저자의 기본소득론은 소득의 ‘원인’ 쪽을 바로 잡자고 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국가에서 시행되는 각종 수당제도가
소득불평등이라는 ‘결과’를 시정하자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118-119면). 여기에서 저자는 오늘날
빈부격차, 특히 청년의 빈부격차는 노동소득보다는 자산소득이 훨씬 더 크게 기여한다고 하며 구체적으로 자산 지니계수
(Gini coefficient)가 소득 지니계수보다 크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133~137면). 쉽게 말하면 자산 세습으로
인한 불평등을 소득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산을 재분배하는 토머스 페인 류의 기
본소득제(기본자산제)가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핵심이라고 본다(136면).
#3 저자 논의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저자는 ‘징발’에 초점을 맞춘 기본소득제가 자산가에 대한 저항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실토한다.
‘지대를 걷자’ 보다 ‘플랫폼세를 걷자’는 생각이 훨씬 폭넓은 공감대 얻는 것은 수익 자체가 원칙적으로 플랫폼 이용자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121면). 저자의 주장은 18세기 후반 토머스 페인이 기본소득제를 주장할 때 그
재원이었던 지대를 건드리는 것이 당대 지주계급의 저항으로 어려웠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고해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웠다는 것을 되새기게 한다.
토머스 페인에 대한 저자의 평가는, 이 책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19세기 말 미국의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가 『Progress and Poverty』(1879)(『진보와 빈곤』(김윤상 역,
비봉출판사, 2016)에서 주장했던 ‘토지 단일세론’이 이상적인 제도로서 소설 — 톨스토이의 <부활> —에서나 구현될 수
있는 비현실적인 제도로 치부돼 왔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재생산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 공개념을 도입한다거나 그와 유사한 주장을 하는 것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회 기득권층과 보수 언론의
태도에서 이 문제의 폭발력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제를 통해 빈부격차 해소에 접근하는 것이
번번이 실패하는 것도 그 이유다.
그런데 저자가 적절히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플랫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구글, 애플, 페이스북(메타),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Big Tech) 기업의 성장 이면에는 플랫폼 이용자의 상호작용이 기여한 바가 크다. 실제 2020년
기준 이들 기업의 미국 주식시장 기준 시가총액의 합계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GDP와 맞먹는다는
보도가 있었다.1) 특별한 생산설비를 갖춘 것도 아닌 이들 기업의 급성장세를 단지
혁신기술(innovative technology)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마치 꿀벌이 모아놓은 꿀을 가로채는 양봉업자처럼
빅테크는 이용자 또는 누리꾼이 일상에서 만들어내는 인지잉여(cognitive surplus)— 인터넷 상에 남기는 ‘좋아요’,
맛집 및 제품 후기, 인터넷 트래픽, 방문기록 등 —에 기반하여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2)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사적 소유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그 땅에서 나오는 지대를 기반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토머스 페인이나 토머스 스펜스, 그리고 헨리 조지와 같은 주장이 오늘날 지주와 기득권층의
반발을 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플랫폼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부가가치는 플랫폼 이용자들의 인지잉여에 기반한
것으로서 그들이 기여한 것을 그들의 몫으로 돌려주자는 주장은 훨씬 설득력이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이기도 하다.
토지공개념, 나아가 지대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제·기본자산제는 수많은 지주의 반발에 부딪히고 그들을
설득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지만, 플랫폼의 수익에 과세하고 이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으로 삼는 것은
원인제공자(수익기여자)에게 소득을 돌려주자는 점에서 논리적이거니와(이점은 지대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에도 공통됨),
수적인 측면에서 그 대상이 지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몇 안 되는 글로벌 기업이란 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구글세로 불리기도 하는 데이터세에 대한 이들 빅테크의 반발은 개별 국가의 입법과정에까지
간여하는 등 강력한 것이지만,3) 빅테크의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란 점에서 미국 외의 대부분 국가가
데이터세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현실은 18세기 인클로저(Enclosure) 때와는 사뭇 다르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또한 시간이 흐르면 지주층의 반발로 지대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소득제가 불가능해졌듯 플랫폼에 대한
과세와 이에서 거둔 돈으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자는 주장 또한 물 건너 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자의 기본소득
논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기본소득 논의는 저자를 포함한 경제학자들이 논의를 주도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토지재산권에 대한
도전, 플랫폼 수익에 대한 과세 등의 논의는 지극히 법학적 논제이기도 하다. 이점에서 저자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133면) 미국 예일대 로스쿨의 브루스 애커만(Bruce Ackerman)과 같은 법학자가 적극적으로 기본소득 논의를
하는 것은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 서평자의 눈을 번뜩 뜨이게 한다. 기본소득 논의를 경제학자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법학의 영역에서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경제학, 법학 등 학제적 연구의 장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 Margaret O'Mara, “The last days of the tech emperors?”,
New York Times, Aug. 3, 2020, p. 9.
2) 이에 대해서는 서평자의 다음 논문 참조. 남형두, “잉여(剩餘) — 빅테크와 양봉업자”,
법철학연구 제25권 제2호, 2022. 8. 31.
3) 개별 국가에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고 영업활동을 하는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에 과세하기
위해 EU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구글세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미국의 반발로 과세 대상 기업이 넓어지는 등 당초
구글세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 참조. 남형두, “[기고] 디지털세, 글로벌 법인세,
그리고 데이터세”, 경향신문 2021. 7. 14.자.
책정보
기본소득, 공상 혹은 환상
저자김공회
출판사오월의 봄
발행일2022.07.02
ISBN9791168730274
KDC338.181
서평자정보
남형두 ㅣ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로스쿨에서 저작권법을 가르치고 있다. �‘정직한 글쓰기’와 관련된 『표절론』, 문학·예술과 관련된
『문학과 법』(편저) 등의 저서가 있으며, 문화산업, 스포츠엔터테인먼트, 플랫폼 등에 관한 논문, 여러 편이
있다.